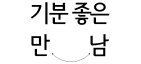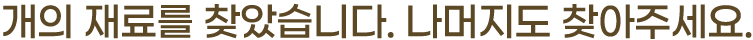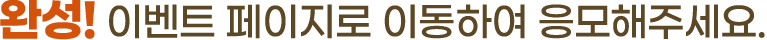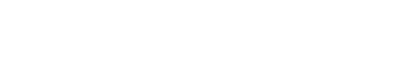라이프&스타일
허명욱 작가

시간이 남기고 간 발자취에 천착하는 허명욱 작가는 매일 다른 색을 빚고 칠한다. 차츰 변해가는 색의 눈빛을 마주 보면서 시간의 흔적을 찾는다. 그랬던 그가 ‘요리’라는 또 다른 흔적의 매개체를 찾았다.마음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음식을 나누는 이들에게 꼭 흔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음식, 마음의 문을 여는 문고리
사진, 회화, 설치, 영상…. 장르에 갇히지 않는 허명욱 작가는 2008년부터'옻칠'로 또 하나의 자취를 더해가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작업실에서 만난 그는 “뉴욕으로 작품을 배송할 준비를 마쳤다“며 한숨을 돌렸다. 지난해 겨울, 갤러리 아라리오에서 개인전을 마치고 세계 3대 아트 페어 중 하나인 ‘아모리쇼(The Armory Show)’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부터 인테리어까지 허명욱 작가가 꼬박 3년간 공들인 용인 작업실은 하나의 갤러리와 같다. 정원 입구에서부터 옻칠된 아톰 설치물이 손님을 맞는다. 작업실에 들어서면 그가 직접 만든 빈티지 가구와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디자이너 소품 이 한가득이다. 이곳에는 타인의 마음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2층 작업실의 다이닝 키친이다. 스탭들과 식사를 하거나 손님들과 작은 파티를 열 때면 추억을 쌓는 작은 프레임이 되기때문이다.
요리로도 이름이 난 그가 이날 준비한 음식은 토마토 샐러드.“대저토마토라 맛있을 것”이라며 그의 손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인다. “제 작업과 요리는 닮은 점이 있어요. 바로 ‘소통’의 매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의 말처럼 요리하는 공간과 작업 테이블은 서로의 모습이 훤히 보이도록 개방돼 있다. 손님들은 허명욱 작가의 경쾌한 칼질을 보며 신이 난다.
스탭들과 작업실에서 간편하게 먹기 위한 요리를 시작하면서 허명욱 작가의 레시피는 점점 늘었다. 필요한 조리도구와 식기는 직접 만든다. 제일 잘하는 요리는 파스타. 그중 산낙지 파스타는 그가 손님들과 가장 재미있게 소통하는 통로다.
“살아 있는 산낙지를 조리하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다 보여드려요.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다거나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품죠. 제 요리 과정을 보고 요리를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제게 요리는 자리에 모인 모두가 감성과 맛, 보는 즐거움까지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묵묵히 찍었던 발자국은 운명이 되고
그의 작품처럼 요리 역시 ‘그날의 기운’이 좌우한다. 이날은 샐러드에 넣을 모차렐라 치즈를 역시 큼지막하게 잘랐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하고 싶네요.(웃음)” 발사믹 소스의 향내를 더한 샐러드를 바게뜨에 올려놓고 한입 크게 물었다. “맛있어요?” 허명욱 작가의 호쾌한 물음에 웃음부터 터졌다.
“제철 식재료로 만들어야 최고의 맛이 난다”는 그는 무화과가 가장 맛있는 가을을 벌써 기다린다. 가을이 오면 그의 주방에는 무화과 샐러드가 자주 오를 것이다. 그가 만든 훈연기에서 구운 고기를 먹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음식은 마음을 여는 마중물이다.

“와, 슈톨렌의 속살이 정말 예쁘네요!” 독일 전통빵인 슈톨렌을 자르던 그가 잠시 손을 멈췄다. 본인이 시간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오후의 나른한 햇살도 그냥 지나쳐가기는 아쉬웠던걸까. 다이닝 키친의 창문을 지나 슈톨렌의 앙금에 잠시 머무른 햇살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고는 장난이 시들해진 아이처럼 곧 떠나버렸다. 직접 만든 검은 옻칠 그릇에 빨간 딸기를, 그 옆에는 ‘컬렉션 드리가드(Collection de Regards)’의 화이트 법랑 찻잔을 놓았다. 프랑스의 유명 공예가 장 밥티스트 아스티에르 드 빌라트가 만든 식기이자 작품이다. “맛있는 음식만큼 잘 담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죠.”
슈가파우더를 뿌리는 그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검은 테이블에 그림 같은 디저트가 놓였다. 음식이 아니라 작품이 놓인 느낌이다.
‘시간을 담는 남자’는 자신의 음식에도 잊히지 않는 시간을 담았다. 수 시간이 넘도록 긴 대화가 이어졌다. 일곱 살, 어머니가 사주신 운동화의 새 느낌이 싫어 일부러 때를 묻혔던 그 시절부터 사진작가, 화가, 옻칠 공예가가 되기까지. 작품에 쓰인 다채로운 색깔같이 그의 삶도 프리즘처럼 다양한 빛깔의 스펙트럼을 품고 있다. “같은 감성을 느낀다는 것이 중요해요. 색으로 느끼든 감성으로 느끼든 기운이 전하는 파동은 제 작업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요리하는 공간과 작업테이블은 서로의 모습이 훤히 보이도록 개방돼있다

시간이 지나간 길, 색으로 남다
허명욱 작가는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행로를 ‘운명’이라고 표현한다. 옻칠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작은 뮤지엄을 세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앞으로의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늘도 그렇게 시간의 품속에서 색을 찾고, 담고, 쌓는 중이다. 칠이 벗겨진 문이나 녹슨 장난감 자동차를 촬영하면서 시간의 흔적을 좇았던 허명욱 작가. 옻칠을 시작한 후로는 색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시간의 결을 쌓고 있다. 옻은 한국 공예의 대표적인 천연 도료로 오랫동안 목가구와 칠기 등에 쓰였다. 그는 옻에 다양한 색을 입혀 금속 화판 위에 여러 번 덧칠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한다. 옻칠 작품은 밑작업에만 석 달이 걸린다. 수양하듯 밑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색을 올릴 수 있다.
작업실 한편에는 순도 99.9%의 금박과 옻칠이 공존하는 작품이 걸려 있다. 금은 영원불변한 속성과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욕망이 되어왔다. 그는 그런 금박과 옻칠을 나란히 둠으로써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그리고자 했다.
“금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간, 오래될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옻칠은 변하는 시간을 뜻하죠.” 찬란한 젊음처럼 자신이 영원히 간직하고픈 욕망과 시간에 의해 끝끝내 변하고야 마는 욕망은 평행을 이룬다. 지난해 5월부터 매일 다른 색을 칠하고 있는 작품 역시 허명욱 작가와 사계절을 모두 보낸 시간의 총체다. “항상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며 색을 입히죠. 그날의 제 기운에 따라 작품도 분명히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색깔 사이로 관객은 시간이 남긴 발자국을 엿볼 수 있다. 이 작업은 올해 5월까지 이어지며, 마지막 색은 모든 빛을 수렴하는 검은색이 될 예정이다. 그가 어렵게 쌓은 색을 검정으로 덮는 이유는 ‘보이는 것 너머를 들여 다봐야 한다’는 은유다.
“겉은 검은색이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겹겹이 쌓인 여러 색채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사라지더라도 어딘가에는 꼭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허명욱 작가는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행로를 ‘운명’이라고 표현한다. 옻칠을 세계에 더 많이 알리고, 작은 뮤지엄을 세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앞으로의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늘도 그렇게 시간의 품속에서 색을 찾고, 담고, 쌓는 중이다.
Writer 윤민지
Photographer 김현희
Place 오키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