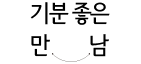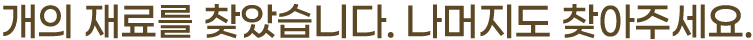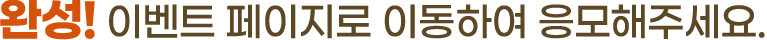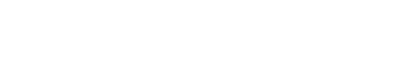미식&여행
유럽 맥주 여행

유럽과 맥주, 그리고 자전거. 이 생소한 조합의 여행을 떠난 데는 그리 많은 이유가 필요치 않았다.
평소 지인들에게 주절대던 말이 있었다. “난 나이가 들면 평생 독일에서 맥주와 소시지를 먹으면서 살겠어.”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 다짐을 좀 더 일찍, 온전히 내 힘으로 실현할 순 없을까?’ 그렇게 60여 일 동안 유럽 9개국, 2,500km가 넘는 길을 달렸다. 사실 눈물과 콧물로 가득한 여행이지만, 직접 페달을 밟고 구르며 찾아 마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맥주들은 특별한 맛과 이야기를 선사했다. 그 사이 ‘자전거’는 맥주의 환상적인 짝꿍인 치킨만큼이나 멋진 여행 파트너가 돼 있었다.


영국 전통 에일을 한 자리에서 만나다
유럽 맥주 여행에 신호탄을 쏘아 올릴 첫 번째 맥주 축제는 매년 8월 런던에서 열리는 ‘GBBF(Great British Beer Festival)’였다. GBBF는 영국 전통의 캐스크 에일(Cask Ale, 맥주를 숙성시킨 통채로 여과나 살균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며, 질소나 탄산가스 등을 인위적으로 주입하지 않은 채 판매되는 맥주)을 부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캄라(CAMRA:Campaign for Real Ale)’ 단체의 주요 행사이자, 영국에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큰 맥주 축제다. 무엇보다 이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굳이 여러 펍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300여 개가 넘는 캐스크 에일 양조장과 다양한 맥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침 일찍 축제가 열리는 ‘런던 올림피아 전시회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산 전용 잔과 안내 책자를 들고 부스를 천천히 둘러봤다. 세상에! 맥주의 스타일도 양조장도 여기 모인 사람들만큼이나 각양각색. 900개가 넘는 탭들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입가에 흐른 침을 한 번 ‘쓰윽’ 닦고 길게 줄지어선 한 부스로 향했다. 상냥한 미소를 짓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맥주를 살짝만 맛보고 ‘루드게이트 양조장(Rudgate Brewery)’의 ‘루비 마일드(Ruby Mild)’ 캐스트 에일을 첫 맥주로 택했다. 떨리는 마음을 움켜쥔 채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입안 가득 퍼지는 검붉은 과일들의 향연,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달콤 쌉싸름한 끝 맛. 지금껏 맛보지 못한 에일의 새로운 맛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서둘러 잔을 채우기 위해 다음 부스로 냉큼 달려갔다. ‘아마 여긴 천국일 거야!’


벨기에 브뤼셀 유일의 람빅 양조장, 칸티용
다양하고 독창적인 맥주가 많은 벨기에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낯선 경험을 선사해줄 양조장이 있다. 바로 자연 발효 맥주인 ‘람빅(Lambic)’을 양조하는 ‘칸티용 양조장(Brasserie Cantillon)’이다. 이곳은 1900년에 설립돼 벨기에 브뤼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람빅 양조장. 미디(Midi)역에서 도보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다. 운 좋게도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아 자전거를 이끌고 양조장을 찾았다.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평범하게 세워져 있는 양조장은 겉보기와 달리 꽤 여러 번 반전의 모습을 보인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지르는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에 한 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녹슨 기계들과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거미줄에 또 한 번 놀랐다. 그간 봐온 거대한 규모의 현대식 양조장과 달리 오래되고 누추했지만, 마치 비밀 창고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과연 이곳에서 맥주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의구심이 풀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람빅(Lambic)’이란 인위적으로 효모를 넣지 않고 공기 중에 부유하거나 오크통에 서식하는 야생 효모, 박테리아 등을 통해 발효되게 하는 전통방식의 자연 발효 맥주다. 대기 중의 미생물들에 의해 맛이 좌우되기에 최대한 그 특유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여기저기 쳐진 거미줄도, 녹도 쉬이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 이후 오크통에서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치며 람빅 특유의 ‘시큼쿰쿰’한 맛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짧은 시간 자유 투어를 마치고 마지막 맥주를 맛볼 시간이 왔다. ‘과연 야생 효모를 머금은 자연 그대로의 맛은 어떨까?’
직원에게서 잔을 받아 들었다. 투어를 마친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잔을 들고 향을 맡았다.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맥주를 살짝 들이켠 순간. 맙소사! ‘이 식초 같은 맛은 뭐야? 이걸 저렇게 태연하게 마신단 말이야?’ 낯선 맛에 깜짝 놀라 다시금 잔을 내려놓았다. 이 맥주의 맛과 친해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독일 쾰른의 자부심 쾰쉬
길에서 만난 여러 독일 친구들이 하나같이 맥주 여행을 한다는 내게 꼭 방문해야 할 도시로 ‘쾰른’을 추천했다. 쾰른은 주변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독일의 대표적인 지역 맥주 중 하나인 ‘쾰쉬(Kolsch)’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독일 맥주법으로 쾰른에서 만들어진 맥주만을 쾰쉬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그만큼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가 바로 쾰른이다.
먼저 쾰른의 관광명소인 쾰른 대성당을 둘러보고 그 뒤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선 쾰쉬를 판매하는 곳들을 쉬이 접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가펠 암 돔(Gaffel am Dom)’과 ‘프뤼 암 돔(Fruh am Dom)’이다. 그중 빨간 글씨로 쓰인 100여 년 전통의 프뤼 암 돔을 찾았다. ‘그래. 저곳이 바로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독일에서 소시지 먹기를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야.’
이곳을 찾은 그 누구보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들어서니 직원이 창가 테이블로 자리를 안내했다. “맥주?”라는 직원의 물음에 바로 “예스!” 크기가 작은 ‘슈탕에(200ml 전용 잔)’에 담긴 쾰쉬를 한 모금 들이키며 감자를 곁들인 소시지를 주문했다.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소시지 한 입과 깔끔한 쾰쉬 한 모금. 둘이 먹다 열이 죽어도 모를 맛이었다. 포크를 들고 감격에 겨워하는 내게 아까 그 직원이 다가와 맥주 한 잔을 더 권했다. 물어
무엇하랴. ‘끄덕이’ 인형처럼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다, 눈 깜짝할 새 불어나 버린 계산서를 보고 흠칫 놀랬다. 굳이 열심히 끄덕이지 않아도 직원들이 쉴 틈 없이 잔을 교체해주니 이곳을 찾는다면 주의하길. 만약 맥주를 그만 마시고 싶다면 거절 표시를 하거나 코스터(컵받침)를 잔 위에 올려두면 된다.



맥주 향기로 뒤덮인 필스너의 도시, 체코 플젠
처음 플젠에 도착한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도시 전체를 뒤덮은 구수한 맥아 냄새에 저절로 페달을 멈추게 된 그 순간을. 라거 계열의 대표 맥주인 필스너의 본고장에 왔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면서 다시 한 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최초의 필스너라는 타이틀을 가진 ‘필스너 우르켈(Pilsner Urquell)’을 맛보기 위해 먼저 맥주 박물관 옆 1층에 있는 ‘나 파르카누(Na Parkanu)’를 찾았다. 이곳은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그대로의 걸러지지 않은 신선한 필스너 우르켈을 맛볼 수 있어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자리에 앉았는데, 직원이 내려놓은 잔엔 세밀하고 풍부한 거품이 올려진 황금빛 필스너 우르켈이 담겨 있었다. 짜릿한 목 넘김에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래. 이거면 충분해.’ 여기에 고소한 ‘타르타르(육회와 비슷한 체코 전통음식)’까지 곁들이니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았다.
플젠에서 필스너 우르켈 양조장 투어는 필수다. 나 파르카누와는 다른, 맥주 생산 공정을 직접 보고 느끼고 맛보는 일은 그 투어 안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 투어의 화룡점정은 단연코 시원한 지하 저장고에서 맛보는 맥주다. 그곳에는 전통 방식으로 숙성되고 있는 거대한 오크통이 있는데, 투어 마지막에 나이 지긋한 직원이 그 오크통에서 맥주를 따라줬다. 갓 뽑아낸 필스너 우르켈 한 잔에 맥주 위 새하얀 거품처럼 구름 위를 두둥실 떠다니는 환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것만으로도 플젠을 다시 찾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최승하 맥주 여행가,
맛있는 맥주를 찾아 여기저기를 여행한다. 마시고, 쓰며, 그리는 일을 통해 좀 더 많은 이들이 나눌 수 있는 풍부한 맥주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두 바퀴로 그리는 맥주 일기(가제)>를 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