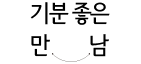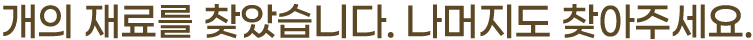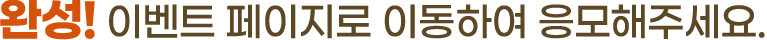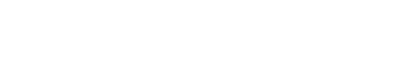미식&여행
전라도 집장

집장? 즙장? 전라도 지역에서는 둘 다 부른다. 옛 고서에는 ‘즙지히’라고 부르기도 했다. 집장은 담가서 며칠 내로 먹는 패스트푸드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을 숙성하는 장류 중에서도 드물게 찰나 같은 순간,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들어내는 게 집장이다. 그러나 집밥처럼 한 번 맛들이면 헤어나기 힘든 매력이 있다.
백문이불여일미(百聞不如一味), 맛을 보면 바로 밥을 찾는다.
집장을 밥과 함께 비벼 먹고, 집장 속에서 삭힌 채소를 반찬 삼아 먹으면
어느새 밥 한 그릇이 사라진다.
고서에서 찾은 전라도 집장의 기록
1913년 최초의 근대식 한국요리책인 <요리제법(料理製法)>을 집필한 방신영 선생은 <조선조리연구서(朝鮮料理製法)>에서 집장 만드는 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가을에 밀기울과 콩을 물에 불려 시루에 찐다. 찐 것을 절구에 찧어서 밤알 만큼씩 덩어리로 빚고 떡둥구마(떡절구)에 담되, 켜켜이 가랑잎이나 짚을 깐다. 잘 덮어서 메주가 뜨기를 기다린다. 메주가 누렇게 되고 거죽이 하얗게 되면 꺼내어 햇볕에 말린다. 잘 마르면 가루로 내고 누룩 가루와 소금과 물을 섞어 꼭 봉하고 따뜻한 양지에 10여 일 두었다가 먹을 때는 설탕을 한다.’ 또 여러 음식 관련 책에는 전주즙장법(全州汁醬法)이 소개되어 있다. ‘가을에 보리나 쌀을 잘 닦아서 1말을 노랗게 볶고, 콩 5되도 볶아서 거피하고 같이 빻는다. 쌀뜨물로 개서 호두 크기로 빚는다. 시루에서 찌고 닥나무 잎이나 뽕잎으로 싸서 황백의 곰팡이가 피면 스스로 마르기를 기다려 가루를 내고 햇볕에 또 말린다. 간장을 쳐서 되직하게 반죽하고, 가지나 오이를 닦고 말려서 층층으로 항아리에 안친다. 그리고 전과 같이 말똥에 묻고 3일마다 더운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해서 9일이면 쓸 수 있고 먹을 때마다 꿀을 조금 넣으면 그 맛을 돋워 절미가 된다.’
집장을 만드는 과정은 과학이다. 미생물을 배양하고, 숙성과 발효에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고, 햇볕에 말려 잡균을 살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말똥 속에 장을 묻으면 효소 활성에 최적화된 온도가 된다. 지금이야 집장 만들 때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조선 시대에는 말똥 속이 효소 활성에 최적의 온도였다. 말똥이 없으면 매일 불을 때는 따듯한 부뚜막 옆에 두어 온도를 맞췄다고 한다.

전라도 어디서든 쉬이 만들어 먹던 집장
집장을 만드는 시기는 음력 7월로 한여름이다. 집장에 재료를 보면 음력 6월에 수확하는 보리와 밀에 콩으로 만든 메주를 넣어 만든다. 보릿고개 지나 담그는 장이다. 들어가는 채소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텃밭에 있는 것을 넣었다. 칼자루만한 무와 보라색으로 물든 가지, 빨갛게 물든 고추 등 가리지 않았다. 전라도 어디서든 예전부터 담가 먹은 것이 집장 이기에, 맛을 보러 전라남도 담양의 기순도 전통장을 찾았다. 명인이 설명하는 집장 만드는 법은 간단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소금에 살짝 절여 숨을 죽이고는 준비한 장에 넣으면 끝난다. 장 재료는 보리와 메줏가루, 그리고 찹쌀죽과 엿기름이다. 여기서 빠지지 말고 넣어야 하는 것이 잘 숙성한 간장. 간장이 다른 재료의 맛을 지휘한다고 한다. 모든 재료를 혼합하고 전기밥솥에 넣고 사흘 정도 삭히면 집장이 완성된다.
집장은 주문하면 바로 나오는 햄버거와 같다.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내보내기 위해 미리미리 재료를 준비해 놓기 때문이다. 비빌 수 있는 장과 비빔에 다양한 맛을 더할 수 있는 채소를 맛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집장을 패스트푸드라 했다. 더운 여름 농촌에 가보면 간혹 설탕물에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방법이다. 집장은 달곰하다. 음력 7월이면 삼복더위에 쌀농사가 한창, 빠르게 한 끼 먹으면서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없을 때 집장은 최고의 반찬이었다.

모습은 소박하지만 이만한 밥도둑이 없다
완성된 집장은 저벅저벅한 국물이 있는 된장에 채소가 빠진 모습이다. 여름 더위에 지쳐 도망간 입맛이 돌아올 만큼 화려하거나 예쁘지 않다. 하지만 백문이불여일미(百聞不如一味), 맛을 보면 바로 밥을 찾게 된다. 집장을 밥과 함께 비벼 먹고, 집장 속에서 삭힌 채소를 반찬 삼아 먹으면 어느새 밥 한 그릇이 사라진다. 따로 찬을 차리 필요가 없다. 무를 씹으면 매운 단맛이, 가지를 씹으면 크리미한 맛이, 고춧잎과 고추는 알싸한 맛이 집장 속에 8첩 반상이 차려진 듯 다양한 맛이 녹아 있으니까 오로지 밥만 있으면 된다.
오는 길에 집장을 조금 얻어 왔다. 입맛이 없을 때 따스한 밥에 비벼 먹으니 한정식이 부럽지 않다. 여름에서 가을 사이 집장이 있다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전어가 없어도 입맛 없다는 투정을 못 할 듯싶다. 만드는 시간이 짧은 장이지만 매력이 철철 넘친다. 지금까지 출장 다니면서 눈으로만 보고 맛보지 않았던 시간이 아깝다.
김진영 푸드 칼럼니스트
24년간 식품 MD로 활동하면서 식재료 산지를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빈 전문가.
여행과 먹거리에 담긴 이야기를 접목해 바른 식재료 콘텐츠를 생산하는 ‘여행자의 식탁’ 대표이기도 하다. 현재 여러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