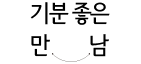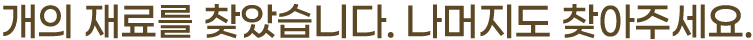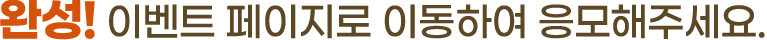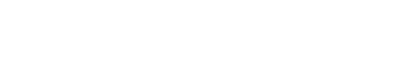라이프&스타일
엄마의 밥상도 변화한다
2024년 키워드가 ‘분초사회’라고 하더니 가성비와 가심비를 뛰어넘어 시간 대비 성능을 의미하는 ‘시성비時性比’가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했단다.

나를 키운 팔 할은 엄마의 손맛
사회초년생부터 일찌감치 자취를 한 터라 나는 해질녘 퇴근길, 한강 다리 를 건널 때마다 괜스레 콧등이 시큰했다. 따뜻한 엄마 밥이 그립고 엄마 의 국이 절실했다.
떠올리자면 이미 수십 년 전 일이나, 두세 달에 한 번씩 고향을 들를 때면 엄마는 페트병에 얼린 사골이며, 밥알 동동 띄운 식혜, 갓 짠 참기름과 들 기름을 가방에 채우기 바빴다. 갖은 반찬을 얼려서 냉동실에 두고두고 먹 을 것, 당장 냉장고에 두고 먹을 것을 구분했다.
부엌일이라곤 설거지나 밥숟가락 놓는 게 전부였던 나로서는 엄마의 도 움 없이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릴 리 만무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한강을 지날 무렵이면 스스로 하루를 잘 보냈다는 안도와 안온이 찾아들었고, 엄 마가 보내온 음식과 나름 내가 할 요리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저녁 밥 상을 그려댔다.
세상 그 어느 나라, 그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낸 우리를,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저녁. 저마다 골목 끝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엄마를 찾 는지도 모른다.
‘빨리 빨리’와 ‘느림의 미학’사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이들답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빨리 빨리’의 민족이다.
부인할 수 없다. 나 역시도 한겨울에도 빨리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아메 리카노를 고집하는 ‘얼죽아’고, 영상물조차 빨리 감기와 스킵은 기본 에다 시리즈물을 요약해 놓은 숏폼을 더 즐기니까. 시절이 이러하니 우리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더 빨리, 더 짧게’ 물질을 소비 하는 삶을 향유하게 됐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과 정반대로 우리 음식은 기 본적으로 장을 비롯해 발효, 염장이 주축을 이루는 터라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천천히, 느리게’ 라는 단어는 한식에 있어 기본값이다. 오죽하면 ‘느림의 미味학’이라고도 할까. 굽고 지지고 볶 고 조리고 찌고 튀기는 다양한 조리법만큼이나 양념을 무치고 재우고 삭히는 과정도 복잡하다. 해서 누군가가 그랬다. 가정간편식 HMR이 야말로 한식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 식문화의 첨병이라고.

오랜 시간과 노고만을 ‘엄마의 밥상’이라 부를 수 있을까?
나의 늙은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곰탕을 끓이지 않는다. 시래기를 말리지도 않는다. 그냥 사 먹으라고 한다. 된장국이나 재첩국, 장어탕처럼 없는 게 없 는 데다, 심지어 그게 더 맛있고 결국 값도 싸게 친다고 당신 스스로 이야기 한다. 따지고 보면 가정간편식의 시성비를 누구보다 빨리 간파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조리든 반조리든 이렇게 간편식이 없다면 나는 밥상을 차 릴 엄두조차 낼 수 있을까?
그 누가 삼사 일간 곰탕을 끓일 것이며, 시래기를 잘 말려서 무쳐 줄 것이 며, 주꾸미를 양념에 재워 양파랑 볶아 먹을 수 있게 손질을 다 해 놓을 것 이며, 갈비를 손질해 양념까지 재워둘 것인가? 전국 필부필부들의 가장 신 선한 식재료와 가장 맛있는 솜씨를 구현한 간편식 덕분에 나는 오늘도 시 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무엇보다 맛의 오류를 걱정할 필요 없이 성대한 저 녁을 즐긴다.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 수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수와 같다”
전국의 노포를 찾는 방송 프로그램을 5년째 같이 하고있는 만화가 허영만 선생이 ‘맛있냐, 없냐?’ 따지기 이전 일찌감치 일갈했다.
다들 그렇다시피 엄마의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나는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